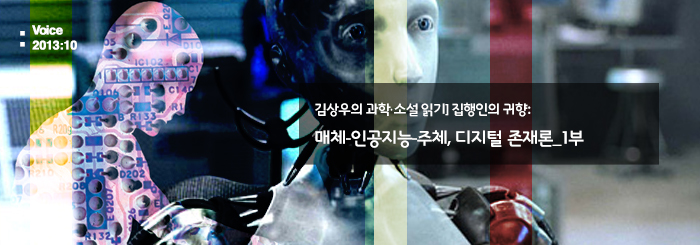디지털 시대의 이미지 존재론- 진동선 사진정보/사진이론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LPm7&fldid=ffvv&datanum=6&openArticle=true&docid=1LPm7%7Cffvv%7C6%7C20100902012127&q=%B5%F0%C1%F6%C5%D0%C0%CC%B9%CC%C1%F6
디지털 시대의 이미지 존재론 진동선(미술학과 박사과정 3차학기) I. 사진영상의 존재론 1. 사진의 죽음 이미지는 늘 한 문화의 삶과 죽음과 관계가 된다. 특히 사진 이미지의 역사적 변천은 더욱 그러하다. 사진의 발명됐을 때 프랑스 화가 폴 들라로슈(Paul Delaroche)는 "오늘로 회화는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의 역사 160년이 지나가는 지금 사람들은 사진의 죽음을 거론하고, 종말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매체미학의 출현, 즉 우리시대 가장 강력한 이미지 툴(Tool)로서 작용하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 때문이다. 디지털 매체미학의 출현은, 아니 좀 더 정확히 디지털 영상의 출현은 사진의 근간을, 사진의 존재론적 근간을 위협하고 흔들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영상비평가 티모시 드럭커리(Timothy Druckery)는 ”사진기록의 근본 자체와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고, 프레드 리친(Fred Ritchin)은 ”충실한 그림 본연의 형태로서 사진의 지위는 심각하게 손상 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앤-마리 윌리스(Anne-Marie Willis)의 경우는 자신의 최근 논문을 통해서 ”특정매체로서 미학적이던 사진의 멸망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가하면, 윌리암 J. 미첼(William J. Mitchell)의 경우도 ”사진발명 150주년이 되던 1989년부터 사진은 죽었다. 좀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그것은 급격히 그리고 영원히 대체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주1) 사진의 존재론에 대한 의심 그리고 시효상실에 대한 암울한 진단은 디지털 이미지의 강력성 때문이다. 디지털 영상에 대한 강력한 시대의 호출은 필연적으로 전통적 매체미학인 사진의 근간, 즉 시간, 역사, 기억을 전제로 했던 존재증명과 부재증명의 무용론을 제기한 것이다. 사진의 소멸에 대한 최근 매체미학자들의 지적은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인조 혹은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가 사실의 인덱스인 사진의 지위를 차지한 현실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포토샵에 의해 수행되는 이미지 가공 작업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든 데 있다. 디지털 이미지가 사진의 지위를 능가하는 것, 그리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시뮬라크르 효과는 더 이상 시대가, 혹은 관객이 지금까지 사진의 수행했던 객관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능력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는데 있다. 그래서 사진은 위기이다. 2. 사진 이미지의 궤적과 존재성 디지털 이미지의 출현은 무엇보다 사진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았던 ‘특수한 정보매체’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의 우려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이제 사진의 원본과 가짜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의구심이며, 또한 사물과 그것의 부호, 자연과 문화, 인간과 기계, 곧 전 세계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이미지 모사화 혹은 이미지 모사효과로 빠질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의구심들은 도리어 진실을 거짓으로부터 꼭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되묻게 한다. 사실 사진은 출현 과정에서부터 기술적인 측면과 인식론적인 특면에 위기를 던졌다. 이러한 위기는 지난 160년 사진의 역사에서 늘 총체적으로, 사진과 그것이 갖는 문화와의 충돌 혹은 반목과 대립 혹은 사진 스스로의 종말의 우려를 제공해 왔다. 예컨대 초기 사진술이었던 다게레오타입, 탈보타입의 종말에서부터 콜로디온 습판, 콜로디온 건판술의 종말, 그리고 나아가 구리판과 유리판의 종말, 여기에 대형 카메라에서 소형 카메라로의 진입, 백금인화, 알부민 인화의 퇴조 등은 사진의 역사가 부단히 새로운 생성과 소멸을 불러 일으켜 그 시대 사진술의 멸망과 이에 대한 존재론적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 초기 비평가들은 이러한 사진의 물리적 변천과정들에 대해서 일찍부터 존재론적 측면에서 연구해왔다. 예컨대 발자크는 다게레오타임 사진술과 그 현상작업을 검은 마술과 관련지었다. 발자크는 사진의 물리적 형체가 무한개의 잎사귀 같은 엷은 껍질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유령과 같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자크는 인간이 만질 수 없는 환영으로부터 실체를 만들어 내는 것, 즉 무에서부터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누군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물체로부터 유령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져서 사진에 전이(轉移)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사진을 거듭해 찍으면 유령의 껍질들이 불가피하게 다 벗겨져서, 생명의 알맹이가 빠져 나간다고 보았던 것이다."(주2) W. 헤이워드(William Heyward)는 초상 사진의 시간성, 즉 초기의 사진가들에게 골칫거리였던 장노출에 따른 이미지 존재론적 변모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시간이 느렸으므로 피사체의 머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보아주기가 어려운 불명료한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과, 또 명료한 사진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미지가 사라지거나, 머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쓸 때 사진에서 얼굴이 시체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했다. 결국 d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툴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초상을 찍으려는 사람의 머리를 잡아주는 틀이었다. 이 틀은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의 인물을 방부 처리한 시체모양으로 얽어매었는데, 그 틀에 매인 사람들이 사진 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먼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만 했다. 초기 사진과 관련한 존재론은 절반은 이미지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절반은 매체의 특징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폴 들라로슈가 사진 출현에 따른 이미지 존재론을 설파한 이래, 사진은 이때부터 끊임없이 이미지의 운명을 시대에 저당 잡히는 숙명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예를 들면 소형 초상화가 다게르형의 엄청나게 싸면서도 정확하고 광택으로 빛나는 초상사진의 출현에 의해 재빨리 도태된 데 대해서 미국 최초의 사진 비평가 N.P. 윌리스가 외쳤던 “금속판 기술자와 그물눈 동판기술자들이여 사라져라. 연기를 들이마시는 굴뚝처럼 너 자신을 먹으렴. 철판조각사, 동판조각사와 에칭업자들이여 질산을 마시고 죽어라! 너의 검은 예술은 끝이 났다. 진정한 검은 예술의 마술이 일어나 꺼져라!”고 했던 일갈이 새로운 장치의 출현에 따른 존재론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주3) 이러한 사진이 근대에 들어 또 다시 안락사를 맛보아야 하는 것은 발터 벤야민(Walter Banjamin)에 의해서였다. 벤야민은 [기술재생산시대에서의 예술작품]에서, 사진은 진품 초상화의 향기를 복제상품으로 무자비하게 변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운명자체까지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 자본주의의 생산양태를 기계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자본주의 자체의 함몰과 죽음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발터 벤야민은 “자본주의가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더욱 착실히 착취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궁극적으로 창출하리라고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 영상은 자신의 존재가 자신에게 독이 되는, 스스로 악몽이 되어버리는 순환성의 위치를 우리는 벤야민에게서 보고, 벤야민의 인식한 사진영상의 존재론적 이중구조가 가히 역사적이거나, 역사적인 숙명성을 담지할 수밖에 없는 매우 특수한 이중성, 즉 다게레오타입의 사진술이 숙명적으로 양화이자 동시에 음화인 특수구조를 논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주4) 사진에 대한, 사진영상에 대한 삶과 죽음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사진의 우연성, 복수성, 다층성 혹은 모호성의 문제도 존재론적 문제로 귀결된다. 벤야민의 지적대로 사진은 탄생부터 불확실함의 안개에 가려 있었다.(주석5) 예컨대 사진이 19세기 초반에 출현하게 된 것, 1790년에서 1839년 사이에 적어도 12명 이상이 사진발명에 뛰어 들었거나 환각적으로 인식했던 시대성도 사진이 시대의 산물이면서, 시대 앞에서 변할 수 있다는 존재론적 전환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진 출현 시기와 동기에 대한 역사적 질문은 가령 왜 이전세대의 학자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갖지 못했을까 하는 점, 왜 사진이 19세기 초 유럽에서만 출현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 그리고 또 사진이 한 순간 특수한 현상으로서 재생되는 양피지처럼 자연철학과 계몽세계의 관점을 동시에 수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그런 것이다.(주6) 미셀 푸코(M. Foucault)는 사진의 출현 동기와 시점 그리고 역사성에 대해서 “태어난 것은 작은 것이긴 하나 서구의 사조(思潮) 전체를 무너뜨리는 절대불가피한 대체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주석7) 요약하면 사진 출생의 아픔은 전근대적 인식론의 죽음과 함께 힘-지식-물체의 경합이라는 독특한 발명의 때와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 "한 존재의 출현은 다른 존재의 소멸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주석8) 3. 사진-시간의 영속적 존재론 사진은 죽음위에 태어난 생명, 즉 공백이 깃든 존재, 사진의 시간성은 삶의 정황과 사건을 통해서 늘 부단히 반복된다. 이미 역사적으로 물리적 시간과 관련된 죽음의 문제는 예를 들면 영국의 또 다른 사진발명자인 헨리 탈보트(Henry Talbot)의 초기 밀착사진에서 나타난다. 탈보트는 이미지를 ‘시간의 해골’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령같은 허상의 출현을 막거나(적어도 지연시키는) 영상 존재의 출현 방법을 터득하고 난 뒤에 이 출현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는 사진에 머물렀던 존재들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런 물체의 유령같은 흔적들이 시간 속에서 왜 계속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를 물었다. 탈보트는 사물의 가장 전이적인 존재로서 모든 덧없고 순간적인 것의 뛰어난 상징이 되는 그림자, 이 ‘자연적인 요술’의 주문(呪文)에 의해 족쇄가 채워지고 그것이 한순간 차지하고 있던 공간에 영원히 고착되어 버린데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종이위에 지나가는 그림자를 받아 잡아매고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순간의 공간에 확고히 고착시키는 사실을 사진영상의 시간적 존재성"으로 보았던 것이다.(주9) 돌이켜 보면 탈보트에게 있어 사진은 과도적인 것과 고착된 것, 즉 시각적인 동시성으로서 덧없는 것과 영원한 것의 불가능해 보이는 연합에 대한 욕망이었다. 그것은 ‘한순간의 공간’이며, 시간이 공간이 되고 다시 공간이 시간이 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었다. 공식적인 사진 발명자 루이 자크 망데 다게르(Daguerre)도 역시 비슷하게 사진을 시간적으로, 영속성과 존재성으로 자신의 사진술을 설명했다. 1839년 3월 그는 작업실 창문 바깥의 탬플거리를 아침, 정오, 저녁의 햇볕에 노출된 세 개의 동일한 그러나 다른 시각의 풍경으로 사진 찍었다. 이 사진들은 그림자의 변화와 영상의 명료함의 차이에 의하여 시간의 진행을 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간격이 있으나 관련이 있는 순간들의 직선적인 배열로서 시간자체를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했다.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풍경이라는 경험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그는 사진에서 시간의 절대성, 시간에 의한 영속적인 사진의 존재론을 가장 우위에 두었다.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되돌이키는 것에서 사진은 또 한번 삶과 죽음과 만난다. 후대의 사진평론가들이 다게르와 탈보트가 사진을 일종의 강신술(降神術)(죽은자와의 대화)‘로서 받아들였던 데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 사진과 시간과 특이한 관계, 서로 예속적이면서 서로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초기 저널에서도 이런 관계성을 볼 수 있는데 1845년 파리 아테네움紙는 “사진은 이제 어제의 태양빛의 모습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주석10) 사진은 이전에 일어났던 것을 되돌이켜 주며 미래에도 일어나리라고 예언한다. 즉 사진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던 간에 사라지고 있는 시간이 시각적으로 각인(刻印)되고, 사진을 보고 있는 주체와 사진 속의 인물들에게는 자신의 불가피한 죽음의 암시한다. 사진의 시간적 존재성은 영속적인 시간일 때,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변화시켜나갈 때 존재론적 힘으로 자리한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사진을 존재론 측면에서 다가간다. 그는 시간에 따라 사진영상의 존재론이 현상을 통해서 죽음과 그 특수한 형태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바르트는 피사체의 ‘거기 존재했음’의 ‘징후’에 대해서 다양한 존재론적 관점에서 언급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진이 하나의 동일한 영상에서 ‘존재했다’와 ‘존재할 것이다’를 동시에 제시한다고 말한다. 그는 타계한 어머니 사진과 죽음에서, 그리고 한 사형수의 1865년 초상에서, “사진인물이 이미 죽었건 아니건 간에 모든 사진은 그렇게 파국적이다.” 더 오랜 숙고 끝에 그는 이런 미래의 예견된 긴장을 상기시키는 괴팍한 시간놀음이 사진을 실제와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궁극적인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바르트에 의하면 사진이 제공하는 사실감은 외양(外樣)에의 충실함 때문이 아니고 차라리 존재에의 충실함에 의해서이다. 이는(반박할 수 없는 시간적인 점거에 의한) 물체와의 유사성(類似性)의 문제가 아니라 피사체의 존재에 관한 문제 때문인 것이다. 그는 "사진의 인물은 죽었으며, 또 죽을 것임이 관찰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11) II. 디지털 이미지의 존재론 지금까지 언급한 사진의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사진이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한 디지털 사진과 가장 큰 차이는 존재론적 측면이다. 즉 디지털 사진은 아날로그 사진의 특징인 형상을 그대로 담는‘색인 영상(idexical image)이 아니라, 수치 데이터로 기록하는‘수치 영상(digit image)’이라는 점이다. 필름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카메라에는 이미지가 잠재되어 존재하지만 디지털 칩을 사용한 디지털카메라에는 잠재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카메라는 원본의 역할로서 고정불변의 형상이 있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언제든 변형 가능한 데이터로서 자리한다. 한마디로 지울 수 없는 것과 지울 수 없는 것의 차이가 사진의 존재론을 일차적으로 규정짓는다. 또 하나는 시간의 존재론적 순서 혹은 순열일 것이다.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는 연속적 프레임 구조이다. 두 번째로 찍힌 대상의 시간은 영원히 첫 번째와 세 번째 찍힌 시간 사이에 존재한다. 그것은 밀착사진에서 매우 잘 나타난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는 불연속 구조이다. 거기에는 순서와 순열이 없다. 즉 그곳에는 첫 번째 노출의 시간, 두 번째 노출의 시간이 없고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첫 번째 프레임으로 올 수가 있다. 삭제(delete)가 가능하기 때문에 탈시간적 프레임 구조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 측면에서 보면 아날로그 사진이 디지털 사진보다 영속적이고 불변의 모습을 갖는다. 오늘날 디지털 영상은 상업적 분야, 특히 광고와 저널리즘에서 전통적인 스틸카메라, 아날로그 영상을 제치고 컴퓨터에 의한 가공 영상으로 급속히 대체되거나 보완되고 있다. 예컨대 이런 현상은 머지않아 종래 은(銀)을 기초로 한 모든 은염사진들이 컴퓨터로 구동되는 픽셀이미지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 이미지는 포토샵을 통해 조작하거나, 디지털 카메라에서 순전히 인위적으로 이미지를 조작, 변조 가능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이미지 앞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하나는 디지털 이미지를 사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또 하나는 사진영상과 디지털 이미지의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 마지막 하나는 매체미학 안에서 아날로그 사진과 디지털 이미지의 근본적인 철학적, 미학적, 문화적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 명징하게 구분되어 이야기되어지지는 않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이미지(디지털 이미지를 디지털 사진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의 문제는 존재론에 앞서 이미지의 진실성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이다. 디지털 영상은 진실에 의심을 품게 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딜레마는 윤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수사학적인 것에 있다. 신문이 특히 그런 경우이다. 신문이 여느 매체보다 앞서 디지털 이미지를 어떤 형태로든 주물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곳곳에 침투한 디지털 영상의 출현은 사실을 언론매체에서부터 진실의 문제를 털어내어야 한다. 디지털 이미지가 노정하고 있는 진실성의 문제는 사진영상으로서 참과 거짓, 실체와 가상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매체미학에서 논의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혹은 매체미학에서 말하는 미디어로서 디지털 문화정치학적 접근과는 다소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사진영상과 디지털 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존재론적 차원에서 변별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문화정치학적 관점뿐만 아나로그 방식의 전통적 시간이미지 재현체계와 디지털 방식의 가상적, 모조적, 탈 시간적 전자이미지간의 도구적 차이, 활용적 차이, 응용프로그램의 차이 그리고 시간, 기억, 역사를 먼저 말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참과 거짓의 문제는 확실히 중대한 문제이다. 사실 도구적 변천과정에서나, 응용프로그램 과정에서 보면 사진의 역사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조작된 영상들에 의해 가득 차 있었다. 실제로 사진이라 함은 그런 것의 역사 이외에는 별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모든 사진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의사(意思)개입과 조작이 매개되었다. 예컨대 조도, 노광시간, 화학농도, 색조범위 등의 조작 이외에 사진은 결국 무엇인가? 세상의 물체를 그림으로, 또한 3차원을 2차원으로 전사(傳寫)하는 단순한 행위로서 사진가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영상을 만든다. 이런 저런 종류의 책략은 따라서 사진작업의 불가피한 일부분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진은 수치적인 영상만큼이나 세상 사물의 외관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해왔다. 이런 주장은 사진이 매체로서 지금까지 탁월한 정체성(正體性)을 부여해 온 유비성(類比性), 즉 사진의 존재론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바르트가 사진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영상의 실제와의 유사성을 이미 배제해버린 것을 기억하거나, 그가 실제 인물은 현재 사진에 실려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 아니며, 대신 그가 사진기 앞에 적어도 한번 서 있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고 말했던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진의 시간성과 공간성이 늘 변함없는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진은 그 자체로서 진실 혹은 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연의 존재, 즉 감광지 위에 자신을 각인(刻印)하기 위해 물질세계의 어느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대상에 의존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사물이 전사(傳寫)되고 조작되거나 강조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사물의 실제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실재성은 참이라기 보다는 사진이 늘 세상과 유일하게 색인(索引)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에 있으며, 이런 관계가 사진의 진실성을 대변해 왔고, 사진적 표현의 근간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진은 언제나 발자국이 발로부터 나오듯이 대상에서부터 나온다. 수잔 손탁(Susan Sontag)이 사진은 “실제에서부터 직접 베낀 그 무엇”이라고 말했던 것이나,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가 “사진은 일종의 실제 자체의 축적”이라고 묘사했던 것은 바로 그 의미이다.(주석13) 그것은 데드마스크, 방금 죽은 자의 얼굴에 충실하듯이, 물체가 손을 뻗어 사진의 표면을 만져서 종위위에 원래물체의 외양에 충실한 흔적을 남기는 것과 같다. 사진은 세상의 참의 증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진의 원본성, 진품성보다는 사람들의 인식한 세상의 닮음의 유비성이 참의 명제를 부여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진은 참 그 자체가 아닌데도 존재에 대한 증명으로서 오랫동안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디지털 이미지는 직접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사진의 모습으로 영상을 만들어 낸다. 사진처럼, 사진의 유비적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은 컴퓨터프로그램 외에는 그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디지털 영상도 어느 정도는 색인성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색인의 약호 방식이 현저하게 다르다. 디지털 이미지는 그 대상이 대개 사진의 외양을 갖춘 추상적인 정보의 자료은행이나 미분(微分)되 수학적 알고리듬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디지털 영상은 기호의 기호이므로 실체의 기호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디지털 이미지는 일련의 표상이라고 인지된 것들을 표현한다. 디지털 영상이 사진에 부여했던, 오랫동안 권능을 인정했던 ‘존재했음’과 ‘존재할 것임’과 전혀 다른 코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는 미래에 있어 과거에 대한 괴로움이 전혀 없고, 시간의 무게에 압사당하지도 않는다. 디지털 영상들은 시간속에 있지만 시간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이런 감각에서 컴퓨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현실은, 유사성과 시간성이 보장된 사지이 약속해주는 ‘현실’의 단순한 모사(模寫)에 불과한 가상(假想)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날로그 사진은 디지털 이미지로부터 무엇을, 어떤 식으로 위협받고 있는가? 사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겐 영상기술의 변화가 그 자체만으로 사진과 이에 수반되는 문화를 증발시키지 못하리란 것은 분명하다. 애초부터 사진은 한 가지 기술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진의 두세기에 걸친 발전은 그 매체 자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 정도에서 수많은 경쟁적인 기술혁신과 쇠퇴의 사건으로 점철되어 왔다. 때문에 사진을 카메라와 필름같은 일종의 묵은 아날로그 기술과 동일시한다 하더라도, 이런 개념 자체가 디지털 이미지의 출현으로 위협당거거나 소멸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진에 부여했던 혹은 사진을 통해 성취하려 했던 이전의 욕망과 개념들과 현재적 그것들과의 충돌이다. 양자가 취하고 있는 매체미학의 본질은 시대적으로 각인된 사회적 코드, 문화적 개념의 차이, 예컨대 자연, 지식, 표현, 시간, 공간, 관찰자, 그리고 대상 그 자체의 코드와 본질에 대한 문제로부터 온다. 따라서 사진을 정의하는 문제, 사진과 이미지를 구분하는 문제는 우리가 아날로그 사진과 디지털 이미지를 의식하고 있건 아니하건간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인식과 지각 그리고 개념들이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매체미학의 툴 안에서 수용, 배제 혹은 닮음과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컴퓨터가 아날로그 카메라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도 사진처럼 계획하고, 조절하고, 지휘하는 인간의 사고(思考)와 세계관에 의존하는 도구이다. 즉 인간의 사고력이, 창의력이 지속되는 한, 이미지의 툴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들은 아날로그 사진과 디지털 이미지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매체의 특성이나 툴을 다루는 프로세스의 변별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 사진적인 것, 즉 사진의 존재론적인 특징을 디지털 이미지가 수용하는가, 하지 못한다면 왜 그런가를 묻는 것이고, 이 문제는 다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우리 곁에 남아있기를 기대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사진의 기술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고 미래에도 여전히 기술이 결정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매체미학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기술은 늘 우리사회와 문화가 갖는 최신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회적 지표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영상의 존재론적 의미를 지나칠 수 없다. 다소 우스광스럽지만 미래를 투시했던 1982년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우리는 모두 조만간 상상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인간, 즉 21세기초의 사회적-의학적-산업적 문화에 의해 제조된 ‘지금의 인간보다도 더 인위적인’ 복제된 인간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블레이드 러너]의 주인공 데카아드(Deckard)의 직업은 얄궂게도 그 스스로가 검색기의 인공부속이 되어야만 판독이 가능한, 인간과 복제인간을 감별하는 일이었다. 영화 서두에서 그는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후 고심하면 할수록 그 차이는 더욱 불분명해졌다"고 말한다. 최종적으로 그는 그일을 포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자신의 주관이 어떤 것인지도 확신을 잃는다.(주석14) 디지털 이미지는 변형을 생명으로 한다. 기술은 끊임없이 변형과정을 겪는다. 사진영상의 위기는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삶이 사진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색인영상으로서 권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물체가 각인하는 색인적인 기호인 까닭에 수치 영상보다 훨씬 우월하는데도 시대는 디지털 이미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제 사물 그 자체가 진실의 여부를 떠나, 참의 여부를 떠나 사물 그 자체가 부호이기 때문일까? 퍼스는 “의미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부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다. (주석15) 그래서 사진 외부의 실체(사물자체)에 대한 실증주의적 증거를 투사하는 사람은 이제 부호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한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퍼스의 말처럼 사진을 ‘부호의 부호화’(그래서 그것조차도 숫자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디지털 이미지를 실체의 또다른 형태로서 논리적으로 포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사진의 정체성은 어떤 확대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부호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동시대성 안에서 또 다른 부호를 ‘찾아내는 것’이다. 환언하면 사진은 표상성은 이제 진품성, 참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삶의 표상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실체가 없어도 표상들의 있다는 것은 이미 세계는 사진에 의해 제공된 증거 혹은 참의 인식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들어진 “감각의 실체”인 것이다. 이러한 사진 개념의 변화는 분명 우리의 문화가 새로운 인식론적인 체계로 변환되고 있음을 말한다. 데리다가 말했듯이 “이 사진의 개념은 모든 반대개념을 사진 찍는다. 이것은 모든 논리의 구성이 될지도 모르는 유령의 관계를 추적한다”.(주석16) 사진은 끊임없이 유령으로 되돌아오는 논리이다. 그 자신이 매개가 된 ‘매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미지의 출현은 사진으로 하여금 종래에 가졌던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진영상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그것의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이 약해졌다는 뜻도 아니다. 사진매체의 중요성은 늘 극적이고, 언제든지 다른 모습으로 혹은 그 얼굴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다. 만약 미래에 사진의 퇴장이 필연적이라면 사진의 직무유기라기보다는 ‘보는 법(지각방식)’ 그리고 ‘사는 법(물질체계)’의 부조화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제프리 배천(Geoffrey Batchen)의 1994년 논문을 상당부분 참고한 것이다. 주석은 제프리 밴천의 것을 그대로 활용했다. 주석(註釋) 1. 티모시 드럭커리(Timothy Druckery)의 글 “Amour Faux'「수치사진 : 영상의 포착, 휘발성 추억, 새로운 몽타주」(San Francisco Camerawork 1988년도의 전시 캐털로그)4~9쪽에, 프레드 리친(Fred Ritchin)의 글 ‘컴퓨터 시대의 포토저널리즘’이 캐롤 스콰이어스(Carol Squiers)가 편집한 「비판적 영상 : 현대사진에 관한 에세이」(Bay Press 출판사, 1990년)의 28~37쪽에, 앤-마리 윌리스(Anne-Marie Willis)의 글 ‘수치화 및 사진의 산채로 죽는 죽음’이 필립 헤이워드(Philip Hayward)가 편집한 「20세기 후반의 문화, 기술 및 창의성」(John Libbey 출판사, 1990)의 197~208쪽에, 마사 로슬러(Martha Rosler)의 ‘영상의 모사, 컴퓨터 조작 : 몇가지 고찰’이 「잡지 Ten. 8 : 수치적 대화」(2권 2호, 1991, 52~63쪽)에, 그리고 윌리암 J. 미첼(William J. Mitchell)의 「재구성된 눈 : 사진 이후의 시대에서 시각적 진실」MIT 출판사, 1992, 20쪽에 나와 있다. 2. 나다르(Nadar)의 '사진가로서의 내 생애‘「October지 5권, 1978년 여름, 9쪽」 3. N.P. 윌리스의 글 ‘자연의 연필’(1839년 4월)이 알런 트라흐텐버그(Alan Trachtenberg)가 쓴 ‘사진 : 주요 단어의 부상(浮上)’에서 인용되었다. 이 글은 마사 A. 샌드와이스(Sandweiss)가 편집한 「19세기 미국의 사진」(아몬 카터 서부예술박물관 간행, 1991, 30쪽)에 실려 있다. 4.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글 ‘기계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1936)이 존 핸하트(John Hanhardt)가 편집한 「비디오 문화 : 비판적인 조사」(Visual Studies Workshop 출판사, 1986)의 27쪽에 실려 있다. 5. 발터 벤야민의 글 ‘사진의 짧은 역사’(1931)가, 알런 트라흐텐버그가 편집한 「사진의 고전적 에세이」(Leete's Island Books 출판사, New Haven 소재, 1980), 199쪽에 실려 있다. 6. 미셀 후꼬(Michel Foucault)의 「사물의 질서 : 인가과학의 고고학」(랜덤 하우스 刊, 1970), 206~207쪽 7. 동일문헌 238쪽 8. 제프리 벤천, ‘욕망으로 불타다 : 사진의 출생과 죽음’(Afterimage 잡지, 17권 6호, 뉴욕, 1990년 1월), 8~11쪽, 그리고 ‘복제를 갈구하며 : 사진의 발명에 관한 노우트’를 로사린 다이프로스(Rosalyn Diprose)와 로빈 패럴(Robin Ferrel)이 편집한 「지도제작 : 후기구조주의 및 육체와 공간의 도해(圖解)」(Allen & Unwin 출판사, 시드니, 1991, 13~26쪽) 9. 헨리 탈보트(Henry Talbot)의 글 ‘사진찍기 좋은 회화예술에 관하여’, 「사진 : 에세이와 영상」(현대예술박물관 출판, 1980, 25쪽) 10. 아테네움지(904호 1845년 2월 22일)의 글이 웨스턴 내프(Weston Naef)가 편집한 「사진 : 발견과 발명」(게티 박물관 출간, 1990, 44권 11호)게 게재된 래리 샤아프(Larry J. Schaaf)의 글 ‘현대 강신술 예제 : J. 폴게티 박물관에 소장된 탈보트의 중요한 실험사진들’에서 인용되었다. 11. 롤랑 바르트, 「카메라 루시다 : 사진에 관한 회고」(Hill and Wang 출판사, 1981) 12. 케이스 캐니(Keith Kenny)의 글 ‘컴퓨터로 변조한 사진 : 독자들은 이를 아는가?’「뉴스사진가」, 1993년 1월, 26~27쪽 13. 수잔 손탁(Susan Sontag)의 책 「사진에 대하여」(펭귄사, 1979), 154W족,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의 논문 ‘초현실주의의 사진적인 조건들’(1981), 「아방가드의 기원」(MIT출판사, 19840, 112쪽 14. 「블레이드 러너」(Ridley Scott 출판사, 1982)의 내용중에서 사진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쥬리아나 브루노(Giuliana Bruno)의 ‘만담(漫談)의 도시 : 포스터 모더니즘과 Blade Runner'「October 지, 41호, 1987 여름」, 61~74쪽 참조 15. 퍼스(Peirce)의 글 ‘기호학으로서의 논리 : 부호의 이론’(1897~1910년경), 자스터스 버클러(Justus Buchler)가 편집한 「파이어스의 철학적 글모음」(도버 출판사, 1955), 98~119쪽 16. 쟈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문법학에 대하여」,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의 번역판 시카고대학 출판사(1979), 48~50쪽 |